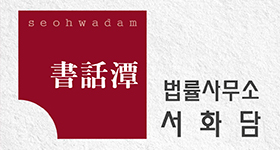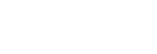[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은 ‘부사장’으로 호칭되고 또 일정 기간 동안 유한회사 사원의 지위에 있었으나 이는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는 피고에 대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아 이를 부정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1심은 유한회사의 출좌좌수를 모두 양도해 사원의 지위에서 벗어난 기간을 근로자로 인정해 원고의 퇴직금 청구 일부를 받아들였다.
원고는 자신이 보험계리사로서 피고 회사에서 근무한 근로자임을 이유로 피고 회사에 입사한 2003년 2월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의 퇴직금 6577만5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한 근로자가 아니라고 다툰다.
1심(2017가단228772)인 서울서부지법 김양규 판사는 2019년 2월 14일 임금(퇴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원고가 유한회사의 출자좌수(2200좌)를 보유하고 사원의 지위에 있었던 2006년 7월부터 2010년 3월까지 사이의 기간은 근로자성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출좌좌수를 양도한 그 이후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는 근로자성을 인정한다.
원고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기간은, ① 2005년 4월부터 원고가 출자좌수를 취득하여 사원의 지위를 취득하기 이전인 2006년 7월까지 1년 3개월 및 ② 그 후 출자좌수를 모두 양도하여 사원의 지위에서 벗어난 2010년 3월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5년 9개월, 합계 7년이 된다. 원고의 퇴직금은 3369만1140원으로 계산됐다.
원고와 피고는 항소했다.
원심(2심 2019나32419)인 서울서부지법 제1민사부(재판장 이은희 부장판사, 판사 이진용, 윤혜정)는 1심판결중 피고 패소부은 부당해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원심은 원고는 ‘부사장’으로 호칭되며 일반 근로자가 아닌 피고의 관리자로서 근무하였다고 볼 사정이 다수 존재하는 점, 원고는 2006년 7월경부터 2010년 3월경까지 유한회사이던 피고의 출자좌수를 취득한 사원의 지위에 있으면서 사원총회에 참석해 회사 운영 전반에 관한 의결권을 행사했던 점, 원고에 대한 급여가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 형식으로 지급되었고 4대 보험에도 가입되지 않은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원고는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권순일)는 2020년 6월 4일 원심판결을 하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인 서울서부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0.6.4. 선고 2019다297496 판결).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51417 판결 등 참조).
회사의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등 참조).
대법원은 원고가 ‘부사장’(임원으로 등기 안됨)으로 호칭되고 또 일정 기간 동안 유한회사 사원의 지위에 있었으나 이는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는 피고에 대하여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 등 경영권은 회장을 비롯한 회장단이 행사했고, 원고를 비롯해 출자좌수를 취득한 경력직 보험계리사들(이하 ‘주주사원 보험계리사들’)은 회사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못했다. 회의록 이외에는 주주사원 보험계리사들이 피고의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 따라서 회의록을 근거로 한 원심의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봤다.
또 원고를 비롯한 주주사원 보험계리사들은 피고가 수립한 계획에 따라 피고 또는 보험회사의 사무실로 정시 출근해 배분받은 용역 업무를 수행했다. 그리고 원고는 그와 같은 용역 업무를 수행하면서 제3자를 고용하는 등으로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도 없었다. 피고가 원고에게 매월 급여를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 형식으로 지급했으나, 이는 피고가 우월적 지위에서 4대 보험의 적용을 피하는 등의 이익을 얻기 위하여 임의로 정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법원, 주주사원 보험계리사가 임금 목적으로 종속 관계서 근로 제공하면 '근로자'
근로자성 부정 원심 파기환송 기사입력:2020-06-22 06:00:00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4,692.64 | ▲67.85 |
| 코스닥 | 948.98 | ▼0.83 |
| 코스피200 | 680.71 | ▲7.85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37,169,000 | ▼210,000 |
| 비트코인캐시 | 901,000 | ▼6,500 |
| 이더리움 | 4,676,000 | ▼4,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9,150 | ▼250 |
| 리플 | 3,072 | ▼23 |
| 퀀텀 | 2,107 | ▼17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37,099,000 | ▼262,000 |
| 이더리움 | 4,675,000 | ▼3,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9,130 | ▼240 |
| 메탈 | 594 | ▼7 |
| 리스크 | 314 | ▼1 |
| 리플 | 3,074 | ▼24 |
| 에이다 | 597 | ▼6 |
| 스팀 | 109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37,180,000 | ▼150,000 |
| 비트코인캐시 | 898,500 | ▼4,500 |
| 이더리움 | 4,676,000 | ▼6,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9,150 | ▼220 |
| 리플 | 3,074 | ▼24 |
| 퀀텀 | 2,102 | 0 |
| 이오타 | 144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