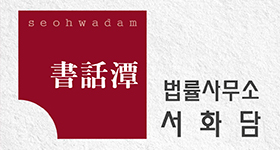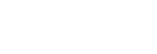[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전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문보경 부장판사·김동욱·서제석)는 2022년 7월 7일 가상화폐 거래소 계정으로 착오송금된 비트코인을 임의로 사용한 피고인에 대해 검사가 처음에 횡령죄로 기소했다가 배임죄를 택일적으로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을 한 사건에서, 배임죄의 성립을 인정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다(2021노3179).
당심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했다.무죄를 선고하는 이상 당심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했다.
항소심은 피고인을 배임죄의 주체로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배임죄의 성립을 부정하고, 비트코인은 횡령죄의 객체인 '재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횡령죄의 성립도 부정했다.
피고인은 2019. 8. 27.경 일본에 있는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알 수 없는 경위로 피해자의 가상지갑에 들어 있던 6.61645203 비트코인(당시 기준 한화 시가 80,700,000원 상당)을 자신의 C 계정으로 이체받아 보관하게 됐다. 피고인은 위 비트코인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어떠한 원인으로 자신의 C 전자지갑에 이체되었는지 전혀 알지 못했으므로, 이러한 경우 비트코인 계정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착오로 이체된 위 비트코인의 반환을 위하여 이를 그대로 보관해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그 무렵 피해자의 비트코인을 임의로 환가하거나 다른 비트코인을 구매하는데 사용하여 80,7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얻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했다.
1심은 택일적 공소사실인 배임죄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6월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유죄부분),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다.
피고인은 "C 거래소 가상지갑에 있던 타인 소유의 비트코인이 알 수 없는 경위로 피고인 계정에 이체된 것이므로 비트코인의 소유자와 피고인 사이에 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어 이체된 비트코인과 관련하여 그 소유자와의 관계에서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이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비트코인이 법률상 원인 없이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전자지갑으로 이체되었더라도 피고인이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피해자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이상, 피고인을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런데도 피고인을 배임죄의 주체로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배임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의 항소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고 판단했다.
◇횡령죄의 객체는 자기가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이므로 재물이 아닌 재산상의 이익은 횡령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 횡령죄의 객체인 재물은 동산이나 부동산 등 유체물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관리할 수 있는 동력도 재물로 간주되지만(형법 제361조,제346조), 여기에서 말하는 관리란 물리적 또는 물질적 관리를 가리킨다고 볼 것이고, 재물과 재산상 이익을 구별하고 횡령과 배임을 별개의 죄로 규정한 현행 형법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사무적으로 관리가 가능한 채권이나 그 밖의 권리 등은 재물에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없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도832 판결 참조).
재판부는 ① 이 사건 비트코인은 물리적 실체가 없으므로 유체물이 아닌 점, ② 사무적으로 관리되는 디지털 전자정보에 불과한 것이어서 물리적으로 관리되는 자연력 이용에 의한 에너지를 의미하는 ’관리할 수 있는 동력‘에도 해당되지 않는 점, ③ 가상화폐는 가치 변동성이 크고 법정 통화로서 강제 통용력이 부여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예금 채권처럼 일정한 화폐가치를 지닌 돈을 법률상 지배하고 있다고도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가상화폐의 일종인 비트코인은 횡령죄의 객체인 ‘재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임의로 소비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했다고 하여 이로써 피고인에게 횡령죄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전지법, 착오송금된 비트코인 임의 사용 1심 유죄 파기 무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 안돼 배임죄 성립 부정비트코인은 횡령죄의 객체인 '재물'로 볼 수 없어 횡령죄의 성립도 부정 기사입력:2022-07-13 14:07:45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5,677.25 | ▲170.24 |
| 코스닥 | 1,160.71 | ▲54.63 |
| 코스피200 | 840.24 | ▲25.65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99,236,000 | ▲115,000 |
| 비트코인캐시 | 831,000 | ▲3,500 |
| 이더리움 | 2,928,000 | ▲7,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470 | 0 |
| 리플 | 2,107 | ▲4 |
| 퀀텀 | 1,393 | ▲7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99,221,000 | ▲140,000 |
| 이더리움 | 2,930,000 | ▲12,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480 | 0 |
| 메탈 | 411 | ▲1 |
| 리스크 | 220 | ▲1 |
| 리플 | 2,105 | ▲3 |
| 에이다 | 409 | ▲1 |
| 스팀 | 77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99,200,000 | ▲130,000 |
| 비트코인캐시 | 832,000 | ▲4,500 |
| 이더리움 | 2,930,000 | ▲11,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480 | ▼10 |
| 리플 | 2,106 | ▲4 |
| 퀀텀 | 1,400 | 0 |
| 이오타 | 99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