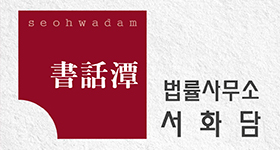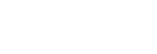A양의 사례는 결코 특별하지 않다. 미국 뉴햄프셔대학교 연구진이 전국 2,600여 명을 조사한 결과, 청소년 5명 중 1명이 18세 이전 온라인 성적 권유를 경험했고, 전체 디지털 성범죄 피해율도 15.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가해자의 절반 이상이 온라인에서 만난 낯선 사람'이 아닌 또래 친구, 연인, 지인이었다는 점이다. 그동안 부모와 교육 당국은 "모르는 사람을 조심하라"고 가르쳤지만, 정작 위험은 아이들 곁에 있었다.
'디지털 성범죄'는 온라인 성적 학대(online sexual abuse), 온라인 성적 권유(online sexual solicitation), 온라인 그루밍(online grooming), 이미지 기반 성적 학대(image-based sexual abuse), 아동 성적 학대 이미지 제작(child sexual abuse image production), 성적 갈취(extortion), 비동의 문자 발송(nonconsensual texting)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국내에서는 디지털 성범죄를 "카메라 등 매체를 이용해 상대방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하거나, 촬영물의 유포·유포협박·저장·전시, 허위 영상물 반포, SNS를 통한 성적 언어폭력·이미지 전송 등 디지털 공간에서 발생하는 성적 괴롭힘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여성가족부가 2024년 발표한 '디지털 성범죄 관련 국민 인식조사 보고서'(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200명 대상)에 따르면, 응답자 10명 중 1명(16.1%)은 디지털 성범죄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했다고 답했다. 특히 19~29세 여성의 38.4%, 30대 여성의 31.8%가 피해를 경험했다고 보고해 젊은 여성층의 피해가 두드러졌다. 피해 유형 중 '온라인상에서 원하지 않는 성적 모욕과 성적 괴롭힘을 당함'이 11.6%로 가장 많았다.
본 기사에서는 미국에서 진행된 전국 단위 실태조사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과 피해 양상을 소개한다. 해당 연구는 핀켈호어(Finkelhor) 박사(뉴햄프셔대학)가 수행한 '미국 아동 온라인 성범죄 실태(Prevalence of online sexual offenses against children in the US)'로, 2021년 전국 온라인 패널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다.

미국 청소년 4명 중 1명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온라인 성범죄 가해자 80%는 낯선 사람이 아니라, 대개는 또래나 아는 지인이었다. / 이미지 디자인=로이슈 AI디자인팀
이미지 확대보기연구진은 만 18~28세 성인 패널리스트 13,884명에게 참여를 요청해 최종 2,639명이 응답했다. 설문은 18세 이전에 경험한 '기술 매개 성적 학대'를 묻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설문에 포함된 기술 매개 성적 학대 유형은 다음과 같다.
· 비동의 이미지 남용: 합의하에 촬영한 이미지를 제3자에게 유포하거나 비합의로 촬영·유포된 경우
· 비동의 이미지 촬영: 의식이 없거나 취중, 주의가 분산된 상태에서 촬영된 이미지, 딥페이크 포함
· 강요된 이미지 요구: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데도 협박·위협·강제·압박을 통해 성적 이미지를 요구한 경우
· 유포 협박: 가해자가 성적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며 유포하겠다고 위협해 피해자로부터 특정 행동을 요구한 경우
· 원치 않는 성적 대화: 인터넷이나 휴대폰으로 원하지 않는 성적 대화를 강요
· 원치 않는 성적 질문: 성적 정보(신체 외형, 경험 등)에 대해 묻는 개인적 질문
· 원치 않는 성적 행위 요구: 원하지 않음에도 성적 행위를 하도록 요구
· 자발적 연상 파트너: 본인이 원해서라도 5세 이상 나이 차이가 있는 상대와 성적 대화·사진·영상 공유
· 상업적 성적 활동: 돈·마약·기타 대가를 받고 성적 대화, 사진·영상 제작·유포, 온라인 성적 활동 수행
■ '온라인 성적 권유' 22.5%…피해자의 82%가 청소년기에 피해 입어
분석 결과, 가장 흔한 피해는 '원치 않는 성적 질문'(18.8%), '성적 대화'(16.9%), '성적 행위 요구'(14.3%)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세 유형을 묶어 '온라인 성적 권유(online solicitation)'라고 명명했으며, 전체 응답자의 22.5%가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성적 이미지를 위협·강요당한 경험은 10.3%, 연상 파트너와의 성적 교류(자발적 포함)는 8.6%였다. 비동의 이미지 공유 4.9%, 비동의 이미지 촬영 2.0%, 유포 협박 3.5%로 집계됐다. 전체적으로 온라인 아동 성학대 경험률은 15.6%, 이미지 기반 학대는 11.0%, 비동의 섹스팅은 7.2%로 나타났다.
피해자의 81.8%는 13~17세 청소년기에 피해를 당했으며, 12세 이하 피해는 전체의 16% 미만이었다. 여성과 트랜스젠더·젠더플루이드 청소년은 남성보다 2배 이상 높은 피해율을 보였다.
■ 가해자는 대부분 주변에 '아는 사람'
가해자 특성을 살펴보면 연령이 불명확한 경우가 많았으나, 청소년과 청년층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다. 특히 주목할 점은 가해자의 55.5~79.5%가 오프라인 지인이었다는 사실이다. 온라인에서만 알던 관계는 소수에 불과했다.
디지털 성범죄 연구 결과는 단순히 '성인 온라인 포식자'에 의한 범죄로만 이해돼서는 안 됨을 보여준다. 상당수 사례는 또래·연인·친구 관계에서 성적 괴롭힘, 성희롱, 데이트 폭력의 연장선상에서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 예방 교육, 또래 관계 속 '경계 설정'까지 포함해야
연구진은 청소년 대상 예방 교육이 단순히 "온라인 상대는 거짓일 수 있다"는 경고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래나 연인 관계에서 나타나는 강압적 통제, 원치 않는 요구 차단, 경계 설정 능력까지 포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조사 결과는 상당수 청소년이 이미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경험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정책·실천 현장에서는 피해 양상의 다양성을 고려한 맞춤형 예방·개입 전략이 필요하다.
▶연구논문
Finkelhor, D. (2022). Prevalence of online sexual offenses against children in the US. JAMA Network Open, 5(10), e2234471. doi:10.1001/jamanetworkopen.2022.34471
▶추가 참고논문
여성가족부 (2024). 디지털 성범죄 관련 국민 인식조사.
김지연(Jee Yearn Kim) Ph.D. 독립 연구자로 미국 신시내티 대학교 형사정책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주요 연구 및 관심 분야는 범죄 행위의 심리학(Psychology of Criminal Conduct), 범죄자 분류 및 위험 평가(Offender Classification and Risk Assessment), 효과적인 교정개입의 원칙(Principles of Effective Intervention), 형사사법 실무자의 직장 내 스트레스 요인, 인력 유지 및 조직행동(Workplace Stressors, Retention, and Organizational behavior of Criminal Justice Practitioners), 스토킹 범죄자 및 개입 방법(Stalking Offenders and Interventions)이다.
김지연 형사정책학 박사 cjdr.kim@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