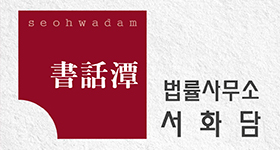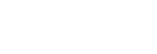[로이슈 진가영 기자] 스토킹은 단순히 불쾌한 연락이 아니라, 법적으로 명확히 금지된 범죄행위다. 2021년 10월부터 시행된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은 반복적이고 불안감을 유발하는 스토킹행위를 처벌하는데, 최근에는 의도와 무관하게 스토킹 혐의로 입건되는 사례도 늘고 있어 스토킹 피의자로 연루되었을 경우 신중하고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에서는 스토킹 행위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중요한 점은 ‘지속’과 ‘반복’, 그리고 ‘객관적으로 불안감을 유발할 수 있는가’이다. 즉, 실제로 피해자가 두려움을 느끼지 못했어도 그 행위가 객관적으로 스토킹으로 볼 수 있는 정황이라면 처벌이 가능하다.
스토킹 혐의로 다뤄지는 대표적인 사례는 거주지나 직장에서의 기다림, 반복적인 메시지 전송, 지속적인 전화, SNS를 통한 접촉 시도 등이다. 그 외에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선물을 보내거나, 제3자를 통해 접근을 시도하는 경우에도 법적으로 스토킹 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이 반복되거나 경찰의 경고 및 접근금지 조치를 무시하는 경우, 수사 단계부터 피의자로 입건되어 본격적인 형사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스토킹처벌법 제18조에 따르면 일반적인 스토킹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 가능하다. 또한, 재범의 경우 전자장치 부착 명령, 접근금지,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 행정적·보호처분도 병행될 수 있다.
문제는 피의자 스스로 자신의 행동이 단순한 호의나 일상적인 접촉이라고 생각해, 스토킹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지 못한 채 안일하게 대응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감정보다는 정황, 반복성, 불안감 유발 요소 등을 중심으로 판단하며, 피의자의 일방적 해명은 방어 논리로서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 섣부른 진술이나 감정적인 대응은 오히려 불리한 정황을 만드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법무법인 더앤 김승욱 변호사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는 피의자의 의도가 악의적이지 않았더라도 반복성과 불안감 유발 가능성만으로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본인의 주장만으로 사건을 해명하려 하기보다 법적 기준에 맞는 방어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며 “경찰 조사 전부터 관련 법령, 정황 증거, 진술 방향 등에 대해 형사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충분히 논의하고 대응하는 것이 사건의 방향을 바꾸는 핵심”이라고 조언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 무작정 해명보다 전략적 대응이 중요
기사입력:2025-04-11 10:00:00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3,748.89 | ▲0.52 |
| 코스닥 | 859.54 | ▼5.87 |
| 코스피200 | 525.48 | ▲1.03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63,973,000 | ▲367,000 |
| 비트코인캐시 | 720,000 | ▲5,500 |
| 이더리움 | 5,914,000 | ▲25,000 |
| 이더리움클래식 | 23,720 | ▲60 |
| 리플 | 3,548 | ▲10 |
| 퀀텀 | 2,930 | ▲15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63,999,000 | ▲240,000 |
| 이더리움 | 5,913,000 | ▲29,000 |
| 이더리움클래식 | 23,740 | ▲80 |
| 메탈 | 746 | ▲3 |
| 리스크 | 335 | ▲1 |
| 리플 | 3,548 | ▲8 |
| 에이다 | 964 | ▲4 |
| 스팀 | 142 | ▲2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63,950,000 | ▲270,000 |
| 비트코인캐시 | 720,000 | ▲5,500 |
| 이더리움 | 5,905,000 | ▲20,000 |
| 이더리움클래식 | 23,570 | ▼80 |
| 리플 | 3,549 | ▲9 |
| 퀀텀 | 2,902 | 0 |
| 이오타 | 211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