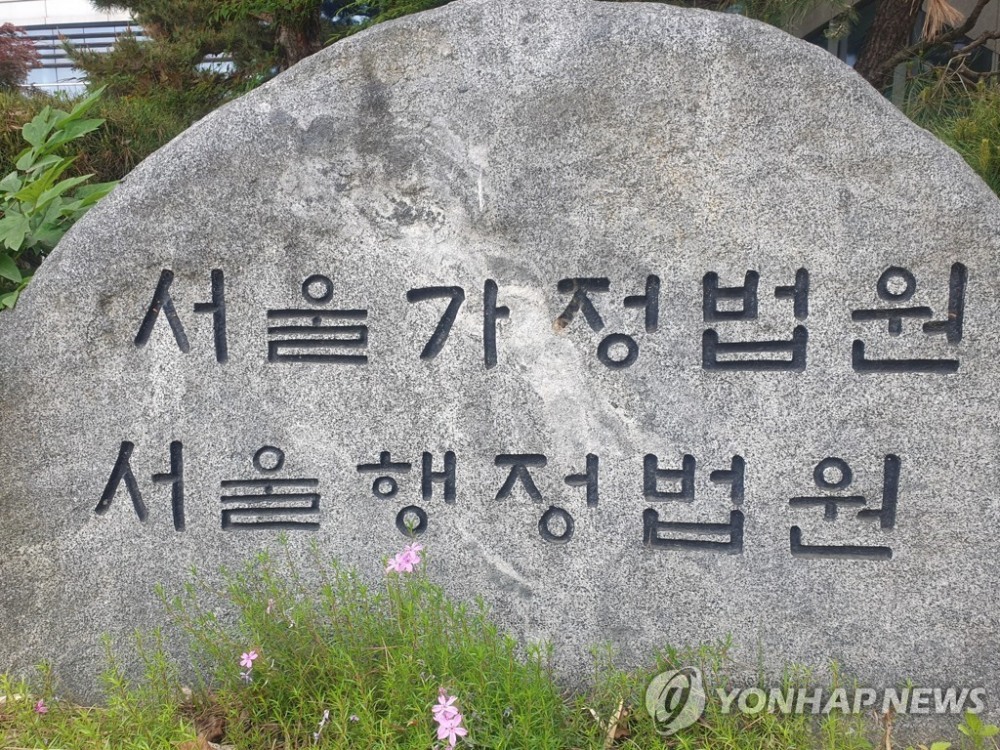[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행정법원은 하반신 마비 등 업무상 재해로 34년간 누워서 투병하다가 장 질환으로 사망한 근로자에게 유족급여 지급을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지 않다고 선고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거절한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A씨 유족이 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고 요양 중 새로운 병이 생겼을 때 이 역시 업무상 재해로 보기 위해서는 애초 업무상 재해와 인과관계가 있음이 밝혀져야 한다"며 "원고가 제출한 사정만으로는 사망과 기존에 승인된 상병·합병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광부였던 A씨는 43세였던 1986년에 당한 업무상 재해로 하반신 마비, 방광 결석 등 증상을 얻었다. 결국 2013년 6월 장해등급 1급 판정을 받았고 비슷한 시기에 진폐증, 활동성 폐결핵 등 증상으로도 장해등급 3급을 판정을 함께 받았다.
사고 후 계속 누워서 투병하던 A씨는 2020년 9월 끝내 사망했다.
직접 사인은 '독성 거대결장'(장이 늘어나는 증상)이라는 장 질환이었다는 것이 법원의 설명.
유족은 이에 의한 사망 역시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청구했다.
하지만 기존에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이나 그 후유증으로 사망했다고 볼 수는 없다며 거절당하자 행정소송에 나섰다.
유족은 "약 34년 동안 누워 투병하면서 심신이 쇠약해지고 면역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만성통증이 더 심해지자 마약성 진통제를 늘려 복용했다가 숨진 것이기 때문에 기존 업무상 재해와 인과관계가 있다며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이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망인의 업무나 기존 승인상병·합병증이 독성 거대결장을 직접적으로 발생시켰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법원 감정의의 판단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감정의는 A씨가 사망 직전 진통제를 늘려 복용한 것은 사실이지만, '고용량 진통제' 사용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
감정의는 만성 폐 질환 등이 독성 거대결장 발병 때 사망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다는 점에서 "기존 승인상병이 급작스러운 사망에 영향을 미쳤을 수는 있겠다"며 유족에게 일부 유리한 판단도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통상적·이론적 가능성을 언급한 것에 불과해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다"며 "사망의 유력한 원인으로 작용했다거나 기존 승인상병이나 그 합병증에 내재하는 고유한 위험이 구체적으로 현실화한 것이라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서울행정법원 판결]산재로 34년 투병하다 장 질환 사망, "유족급여 대상 아니다" 선고
기사입력:2024-09-30 14:15:31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5,677.25 | ▲170.24 |
| 코스닥 | 1,160.71 | ▲54.63 |
| 코스피200 | 840.24 | ▲25.65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98,760,000 | ▲60,000 |
| 비트코인캐시 | 811,500 | ▲2,500 |
| 이더리움 | 2,897,000 | ▼2,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310 | 0 |
| 리플 | 2,088 | ▲2 |
| 퀀텀 | 1,373 | ▲1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98,751,000 | ▲52,000 |
| 이더리움 | 2,899,000 | ▲2,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320 | ▼10 |
| 메탈 | 409 | ▲1 |
| 리스크 | 221 | 0 |
| 리플 | 2,088 | ▲2 |
| 에이다 | 404 | ▲2 |
| 스팀 | 76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98,800,000 | ▲100,000 |
| 비트코인캐시 | 811,500 | ▲4,000 |
| 이더리움 | 2,897,000 | 0 |
| 이더리움클래식 | 12,360 | ▲10 |
| 리플 | 2,086 | 0 |
| 퀀텀 | 1,382 | 0 |
| 이오타 | 100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