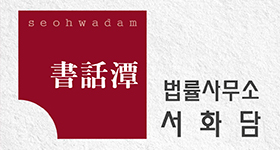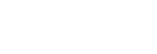[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2022년 5월 31일 소송비용에 포함되는 변호사 보수의 산정방법이 문제가 된 사안에서,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규칙(보수규칙)에 따라 산정된 금액에 피신청인의 부담비율(70%)을 적용해 산출한 변호사보수액이 신청인이 실제 지출한 변호사보수액보다 적다는 이유로 신청인이 지출한 변호사보수 전액을 피신청인(재항고인)이 상환해야 하는 소송비용으로 인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부산지법)에 환송했다( 대법원 2022.5.31.선고 2022마5141 결정).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인과 피신청인이 3:7로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한 소송비용분담재판을 기초로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자신의 변호사보수 상당액에 관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한 사건이다.
당사자 사이에 소송비용을 일정 비율로 분담하도록 재판이 된 경우로서 민사소송법 제111조 제2항에 따라 소송비용액확정을 신청한 당사자에 대해서만 소송비용액을 확정할 경우 법원은 신청인으로부터 제출된 비용계산서에 기초하여 지출한 비용총액을 산정한 다음, 그 비용총액에 대하여 소송비용 부담재판의 분담비율에 따라 상대방이 부담할 소송비용액을 정하여 그 금액의 지급을 명하는 방법으로 소송비용액을 확정해야 한다(대법원 2015. 2. 13. 자 2014마2193 결정 참조).
한편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은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당사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구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2018. 3. 7. 대법원규칙 제27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보수규칙’이라 한다) 제3조 제1항은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는 당사자가 보수계약에 의하여 지급한 또는 지급할 보수액의 범위 내에서 각 심급단위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당사자 사이에 소송비용을 일정 비율로 분담하도록 재판이 된 경우로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한 신청인에게 피신청인이 상환해야 할 변호사 보수를 확정할 때에는, 신청인이 변호사에게 보수계약에 따라 지급하거나 지급할 금액과 구 보수규칙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비교하여 그중 적은 금액을 소송비용으로 결정한 다음, 그에 대하여 소송비용 부담재판의 분담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해야 한다.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을 상대로 주주권 확인 등의 소(이하 ‘본안사건’)를 제기했다. 제1심 법원은 2018. 1. 18. 피신청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면서 ‘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는 판결을 선고했다(부산지방법원 2016가단353131호). 피신청인은 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항소심 계속 중 신청인 1에 대해서는 301,607,886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고, 신청인 2 회사에 대해서는 신청인 1과 연대하여 444,307,143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내용의 제2예비적 청구를 추가했다.
항소심 법원은 2020. 8. 28. 피신청인의 신청인 1에 대한 제2예비적 청구 중 일부만을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와 항소를 각하 또는 기각하면서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 중 신청인 1과 피신청인 사이에 생긴 부분의 70%는 피신청인이, 나머지는 신청인 1이 각
부담하고, 신청인 2 회사와 피신청인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는 판결을 선고했다(부산지방법원 2018나42450호). 위 판결에 대하여 피신청인과 신청인1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2021. 1. 14.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 부담한다.‘는 판결을 선고했다(대법원 2020다267842호).
신청인들은 본안사건(주주권 확인 등 소)의 제1심과 항소심에서 변호사 소외인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했다. 신청인들은 변호사 소외인과 제1심 변호사 보수와 관련해서는 보수를 구체적으로 약정하는 내용의 위임계약서를 작성했으나, 항소심 변호사 보수와 관련해서는 아무런 위임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변호사 소외인에게 신청인 1은 항소심 성과보수 명목으로 330만 원을 지급했고, 신청인 2 회사는 제1심 착수금 명목으로 220만 원을, 항소심 착수금 명목으로 330만 원을, 항소심 성과보수 명목으로 770만 원을 지급했다.
원심(부산지법 2022.1.5. 2021라2501 결정)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피신청인이 신청인 1에게 상환해야 하는 소송비용 중 항소심 변호사 보수를 결정하면서 구 보수규칙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계산할때 소송비용 부담재판에서 정해진 소송비용 분담비율을 적용하여 구 보수규칙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547만1254원[781만6078원{6,800,000원 + (301,607,886원 – 200,000,000원) ×
0.01} × 70%]으로 인정하고, 신청인 1이 변호사에게 보수계약에 따라 지급한 항소심 변호사 보수액 330만 원이 그보다 작다는 이유로 신청인 1이 변호사에게 지급한 보수 330만 원 전액을 피신청인이 신청인 1에게 상환해야 하는 항소심 변호사 보수로 인정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피신청인이 신청인 1에게 상환할 소송비용 중 항소심 변호사 보수는 신청인 1이 변호사에게 보수계약에 따라 지급한 금액인 330만 원과 구 보수규칙 제3조 제1항 [별표]에 따라 산정한 금액인 781만6078원 중 더 적은 금액인 330만 원에 대하여 소송비용 부담재판의 분담비율 70%를 적용하여 계산된 231만 원(3,300,000원 × 70%)이 되어야 한다.
원심결정에는 소송비용액의 확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재항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법원, 지출한 변호사보수전액 소송비용인정 원심 파기환송
기사입력:2022-06-14 10:00:37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5,163.57 | ▼207.53 |
| 코스닥 | 1,108.41 | ▼41.02 |
| 코스피200 | 756.95 | ▼33.43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93,968,000 | ▼45,000 |
| 비트코인캐시 | 684,000 | ▼4,500 |
| 이더리움 | 2,750,000 | ▲5,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1,910 | ▼20 |
| 리플 | 1,763 | ▲24 |
| 퀀텀 | 1,292 | ▼11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94,107,000 | ▼180,000 |
| 이더리움 | 2,755,000 | ▲2,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1,900 | ▼50 |
| 메탈 | 383 | ▼3 |
| 리스크 | 175 | ▼1 |
| 리플 | 1,765 | ▲22 |
| 에이다 | 366 | ▼2 |
| 스팀 | 71 | ▼1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93,970,000 | ▼40,000 |
| 비트코인캐시 | 682,500 | ▼6,000 |
| 이더리움 | 2,749,000 | ▲4,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1,840 | ▼110 |
| 리플 | 1,761 | ▲21 |
| 퀀텀 | 1,291 | ▼25 |
| 이오타 | 99 |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