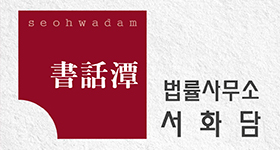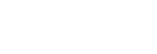[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2021년 7월 15일 회사가 주식을 소각하고 주식소각대금인 16억 상당을 대표이사에게 지급하자, 소수주주(원고)가 주식소각절차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대표이사(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주주대표소송)에서, 1심은 원고패, 원심은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지만 상고심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법)환송했다(대법원 2021.7.15.선고 2018다298744 판결).
OO상사가 이 사건 제소청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자, 원고(발행주식 총수의 15.8% 1,167주 보유 주주)는 2017년 8월 21일 이 사건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했다.
1심(2017가합25363)인 서울북부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이근영 부장판사)는 2018년 5월 24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1심은 이 사건 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이 없음에도 주식을 소각한 경우, 이사에게 상법 제341조 제4항의 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되는데, ‘주식 소각’의 경우에는 ‘자기주식의 취득’과는 달리 회사가 이사에게 상법 제341조 제4항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 회사가 피고의 주식을 소각함에 있어 상법 제343조 제1항, 제2항에 따른 자본금 감소의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하자로 인해 주식소각 자체의 효력여부가 문제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상법 제341조에 따른 자기주식취득에 의한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이렇듯 자본금 감소절차를 거치지 않은 주식소각에 대해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사건에서, 원고는 1심에서 청구가 기각되자 원심(2심)에서 상법 제399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선택적으로 추가했다.
원심(2심 2018나2032263)인 서울고법 제14민사부(재판장 유헌종 부장판사)는 2018년 11월 15일 원고패소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는 회사에 5억 원 및 이에 대해 2014. 7. 1.부터 2018. 11. 15.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나머지 원고 항소는 기각했다.
주식 소각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식 소각 대금 명목으로 회사의 자금 16억 상당을 무단 유출해 회사에 손해를 입혔음을 원인으로 하여 상법 제399조에 의한 이사의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것이고, 이러한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주주대표소송으로 추궁할 수 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배척했다.
원심은 상법 제341조 제4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하는 한편, 원심에서 추가된 상법 제399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했다. 그런데 원심은 인용된 청구를 주문에서 기재하지 않은 채, 1심판결중 원심이 인용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면서 피고에게 그 금액의 지급을 명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원심이 원심에서 추가된 상법 제399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이상 1심판결을 취소하고 선택적으로 추가된 청구를 인용하는 주문을 선고해야 한다. 그런데 원심은 상법 제341조 제4항에 따른 청구를 기각한 1심판결을 원심이 인용하는 금액의 범위에서만 취소하고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면서 원심에서 선택적으로 추가된 청구를 인용하는 주문을 선고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항소심에서의 선택적 병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선택적 청구에 대한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있고,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제소청구서에 기재하지 않은 청구권을 대표소송 진행 중 선택적으로 추가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본 원심 판단을 수긍하면서, 선택적 병합에 대한 판단 누락과 상법 제399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지연손해금 기산점에 대한 심리미진을 지적하며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주주가 아예 제소청구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대표소송을 제기하거나 제소청구서를 제출했더라도 대표소송에서 제소청구서에 기재된 책임발생 원인사실과 전혀 무관한 사실관계를 기초로 청구를 했다면 그 대표소송은 상법 제403조 제4항의 사유가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적법하다. 반면 주주가 대표소송에서 주장한 이사의 손해배상책임이 제소청구서에 적시된 것과 차이가 있더라도 제소청구서의 책임발생 원인사실을 기초로 하면서 법적 평가만을 달리한 것에 불과하다면 그 대표소송은 적법하다. 따라서 주주는 적법하게 제기된 대표소송 계속 중에 제소청구서의 책임발생 원인사실을 기초로 하면서 법적 평가만을 달리한 청구를 추가할 수도 있다.
상법 제399조 제1항에 따른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로서 이행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이사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을 진다(대법원 2021. 5. 7. 선고 2018다275888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상법 제399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금에 대하여 피고의 지체책임을 인정할 때 피고가 언제 이행청구를 받았는지에 관하여 심리할 필요가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법원, 주식소각절차 문제제기 대표이사 상대 손해배상 청구 주주 일부승 원심 파기환송
기사입력:2021-08-02 07:00:00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5,089.14 | ▼74.43 |
| 코스닥 | 1,080.77 | ▼27.64 |
| 코스피200 | 748.10 | ▼8.85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4,065,000 | ▼75,000 |
| 비트코인캐시 | 743,000 | ▲7,500 |
| 이더리움 | 3,045,000 | ▲15,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3,040 | ▲60 |
| 리플 | 2,160 | ▲26 |
| 퀀텀 | 1,398 | ▲12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4,161,000 | ▲53,000 |
| 이더리움 | 3,046,000 | ▲21,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3,040 | ▲80 |
| 메탈 | 417 | ▼1 |
| 리스크 | 191 | ▼1 |
| 리플 | 2,159 | ▲24 |
| 에이다 | 409 | ▲2 |
| 스팀 | 77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4,160,000 | ▲20,000 |
| 비트코인캐시 | 743,500 | ▲7,500 |
| 이더리움 | 3,045,000 | ▲13,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3,030 | ▼20 |
| 리플 | 2,160 | ▲25 |
| 퀀텀 | 1,345 | 0 |
| 이오타 | 109 | ▼0 |